티스토리 뷰
조선 당쟁 //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조선 당쟁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좋지 않다. 하지만 당쟁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당쟁에 대한 나쁜 인식은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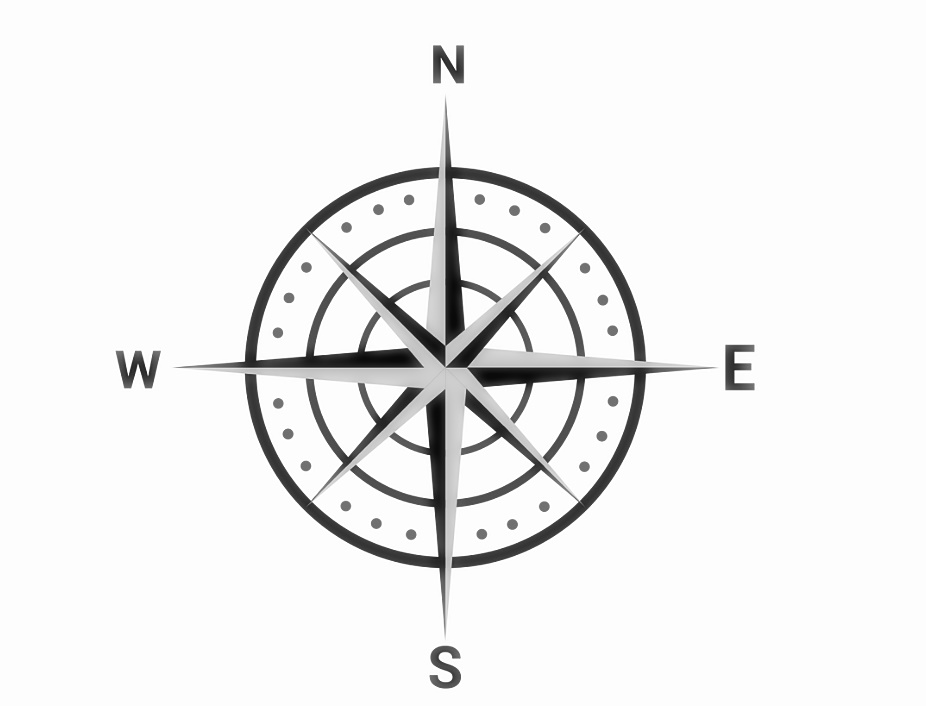

조선시대 당쟁은 선비들이 서로 이념적 대결만을 한 것만 아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층과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계층 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에서 당쟁은 시작되었다.
훈구파 VS 사림파
조선 초기에서 선조까지 당쟁은 선비들 간 당쟁이 아니고 집권세력인 훈구파와 성리학을 공부한 지방의 지주층인 사람 파간의 갈등이 당쟁으로 변했다.
훈구파(勳舊派)는 말 그대로 공신을 말한다. 조선 초기에서부터 중종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신들이 많았다. 왕이 즉위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공신들이 대거 탄생했다.
특히 계유정난으로 즉위한 세조는 5번이나 공신을 책봉했다. 이러한 공신들은 자신들의 가족들도 중앙 정계로 진출시켜 세력을 형성했다.
사림파(士林派)는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형성된 정치집단이다. 고려말 삼온 중 한 명인 길재의 제자들이 주측이 되었다. 이들은 과거제도를 부정하기도 했는데 과거제도는 단점이 많아 사림이 추천하는 사람이 정계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구파와 사림파간의 본격적인 당쟁은 연산군과 중종 때 발생했다. 흔히 말하는 "사화"가 사림이 화를 입는다는 뜻이다. 연산군 시절 훈구파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사림을 대거 숙청한다.
중종 때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는 대대적으로 훈구파를 몰아내고 정치개혁을 단행하지만 "기묘사화"를 통해서 사림파는 또다시 숙청된다.
동인 VS 서인
본격적인 당쟁의 시작은 선조 때부터이다. 이전까지는 훈구파와 사림파간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 파간의 갈등으로 당파가 형성된다.
최초의 당파는 "동인과 서인"이다. 임진왜란 이후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이 너무 심했고 그로 인해서 임진왜란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동인과 서인은 엄청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생겨난 것이 아니다. 동쪽에 살아서 동인, 서쪽에 살아서 서인이다. 이름이 붙이는 것은 간단했지만 발생하게 된 이유는 나름 복잡했다.
공식적으로 동서인이 생겨난 것은 선조때 "이조전량"이라는 자리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조전량은 직급이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영향력이 큰 자리였다.
김효원이 이조전량 후보로 거론됐는데 심의겸이 반대를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된다. 김효원이 한양 동쪽인 건천동에 살고 있어서 "동인"이라 불렀고 심의겸은 서쪽 정릉동에 살고 있어서 "서인"이라고 불렀다.
이조 전량 때문에 나누어진 파벌은 "정여립 사건"으로 서인이 조정을 장악한다. 정여립은 동인 계열 사람이었다. 이때 동인들이 대거 숙청되는 "기축옥사"가 발생한다.
기축옥사는 조선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옥사였다. 기축옥사를 주도한 것은 서인 강경파 정철이었다. 이후 정철의 건저 사건이 생기면서 동인이 집권한다.
동인은 영남학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황과 조식의 학통을 이어받았고 류성룡과 이산해, 정언신 등이 있었다.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학통을 이어받는 기호학파였고 정철과 윤두수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북인 VS 남인
기축옥사로 세력을 잃었던 동인은 다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기축옥사를 계기로 서로 내부 갈등으로 갈라지게 됐다는 설과 동인 집권 이후 정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설이 있다.
기축옥사로 서인이 집권을 했지만 선조의 후계자 문제로 정철이 삭탈관직을 당한다. 그리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정철을 유배 보내자는 세력과 사형시키자는 세력이 갈등을 한다.
사형을 주장한 이산해와 이발을 "북인"이라 했고, 유배를 주장한 유성룡과 우성 전을 "남인"이라고 했다. 유성룡이 남산 밑에 살아서 남인이고 이산해는 북쪽에 살아서 북인이다.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로 분파되었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소북파는 몰락한다. 광해군 시절에는 북인 특히 대북파가 정권을 잡는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대북파는 완전히 몰락을 했고 다시는 조선시대 정계에 나타나지 못했다. 인조가 즉위하면서 서인이 다시 집권한다.
노론 VS 소론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은 약 60년간 서로 공존하면서 정치를 했다. 서로 비슷한 비율로 관직을 나누어 가지면서 인조 이후 효종과 현종 때까지 상호 견제하는 이상적인 붕당정치를 했다.
이후 현종 시대에 발생한 예송논쟁을 계기로 남인이 정권을 주도한다. 숙종시대에 경신환국으로 남인은 대거 숙청되고 조정은 서인이 장악한다.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는데 노론의 대표는 송시열이고 소론의 대표는 윤증이다.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된 발단은 학문적 견해 차이였다.
노론은 영조의 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정조 이후 세도정치라는 독특한 정치를 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정권을 장악했다. 노론은 다시 시파와 벽파로 분파되었다.
조선 당쟁의 중심 당파를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시작되었다.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분파되었고,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북인은 다시 대북파와 소북파로 분파되었고 노론은 시파와 벽파로 다시 분파되었다. 고종이 즉위하기까지 이러한 붕당정치는 이어졌다.
